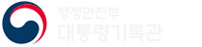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정책 칼럼Ⅰ
최근 영국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
광역화와 시사점
정준호 (정책기획위원회 초광역 TF 위원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1980년대 이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수도권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화 기반의 분권화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검토해 본다.
지방소멸과
한국판 러스트벨트에
대처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초광역권 논의 대두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는 심상치 않다. 2010년대 이후 2%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비수도권에서 조선과 자동차 등 일부 산업들이 구조조정에 따라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청년층의 순인구 이동이 강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인접 지자체 간의 연합 또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이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비수도권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울·경 메가리전 논의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 연합 또는 통합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5+2 초광역권 전략이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초광역권 전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이 강하고 북부와 남부지역 간 격차 -‘남북분단(North-South Divide)’- 가 심한 영국(잉글랜드)은 2010년대에 들어와 도시권(city-region) 중심의 분권화를 추진해 왔다. 외견상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영국이 어떻게 최근에 광역화 기반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신노동당 정부의
광역 정부(Regional Government)의
출범 시도와 좌절
영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로컬(Local) 수준인 대도시(Metropolitan) 및 카운티(County)/셔(Shire)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과 로컬 간 중간 영역이 실종되어(Missing Middle)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려는 시도, 즉 로컬 단위를 ‘광역 단위(Region)’로 바꾸려는 기획들은 1960년대 이후 주로 노동당 집권 시기에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계획위원회(Planning Councils), 지역청(Regional Government Offices), 지역발전기구(Development Agencies) 등이 그것이다.
1979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고 대처 총리는 런던과 같은 대도시권을 로컬 수준의 단일 계층으로 만들어 사실상 광역 런던 시장의 정치적 견제를 없애 버렸다. 양당 체제인 영국에서 노동당은 주로 북부지역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이 결집한 반면에 보수당은 부유한 남부지역 및 농촌지역 중심으로 지지기반이 견고하다. 대처 집권 이전 광역 런던은 GLC(Greater London Council)로 지칭되며 노동당의 아성으로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런던 꼬뮌’이란 별칭이 붙어 있었다. 이를 의식하여 대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2010년대 이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광역화는 사실상 1970년대 행정구역 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초광역권 논의도 대략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행정구역 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표 1> 영국의 지역정책 거버넌스 기조
출처 : 편집실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자 대처 이전으로 행정구역 체계를 되돌리는 정치적 노력이 나타났다. 이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자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잉글랜드에서 도시 중심지와 주변 배후지역을 아우르는 광역(regional) 정부를 출범하려고 시도했다. 전자는 성공하였으나 후자는 2004년 이후 주민투표의 부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서 런던 시장을 선거에서 선출하는 GLA(Greater London Authority)라고 일컬어지는 광역 런던시가 2000년 복원되었는데 이는 전술한 GLC가 1986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이는 주로 교통, 경제개발 및 전략적 계획, 소방·구조 및 치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노동당 정부는 광역 정부를 런던 이외 잉글랜드 지역에서 출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별 행정기관들을 통합한 지역청(Regional Governent Offices), 지역의 경제개발과 전략적 계획을 담당하는 민관합동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역의회(Regional Assembly) 등을 설립한 바가 있다. 이러한 광역화 기획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 해소, 광역 단위의 민의 전달 도모, EU 차원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응하는 조치 등에 기인하고 이면에는 노동당 정권의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러한 광역화 시도가 무산되자 신노동당 정부는 2006년 이후 기능지역 중심의 도시권 광역화를 내세웠다. 이는 배후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비대도시지역의 광역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대도시권에서 대처 집권 이전의 행정구역 체계로 되돌아가려는 기획이다. 도시권은 중심도시와 인근 배후지를 아우르는 런던 이외의 버밍햄, 셰필드, 리즈, 로팅햄, 뉴캐슬 등 대도시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도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런던과 남부 잉글랜드에 대한 길항력(Counterveiling Forces)을 가지면서 분권화에 가장 부합되는 공간규모라는 것이다. 2009년 ‘지방 민주주의 : 경제 발전과 건설 법안(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을 제정하여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와 광역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가 법적 기구로서 도시권 정책의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이 중에서 후자는 강력한 후보였으며 이는 1986년부터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와 인근의 지자체들로 구성된 AGMA(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노동당 정부의 광역화 시도는 중앙정부의 재분배적인 공간정책 대신에 성장지향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것이며 여전히 지역 단위의 자치와 유연성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치적 기획이 아니다.
최근 보수당 정부의
도시권 단위의 분권화
2010년 보수당 연정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 무렵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영국 정부는 재정 긴축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를 반영하여 보수당 연정은 작은 정부와 큰 사회(Big Society)를 내세웠으며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로컬 단위로의 분권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신노동당 정부 집권기에 설립했던 지역발전기구, 지역청, 지역의회 등이 폐지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영연방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의 영향으로 잉글랜드 지역의 분권화 요구를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보수당 정부에 주어졌다.
2010년대 중반 보수당 정부가 단독 집권하면서 재정 긴축과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의 정치적 파급효과로 인해 보수당 연정의 로컬 기반의 분권화가 가진 난점을 돌이켜 보게 된다.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노동당 정부에서 논의되던 대도시가 분권화의 적절한 공간 규모로 재차 호명된다. 이는 도시권 협상(City Deals)과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으로 구체화하였다.
도시권 협상은 복수의 지방정부들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도시권과 중앙정부 간에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인프라 투자와 재원 조달에 대해 일종의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개발과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거버넌스 개혁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도시 간 경쟁을 고무하기 위해 도시권과 개별 협상을 선호하여 협상 내용은 도시권별로 상이하여 비대칭적이다.
보수당 정부는 도시권 협상을 토대로 도시권이 연합지자체(Combined Authorities)로 출범하는 분권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는 도시권이 법적 기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경제개발, 치안, 소방, 교통 등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CA는 광역 런던시를 벤치마킹한 것이며 2016년 3월 현재 12개 지역이 분권 협상을 타결한 바가 있다. 이는 대도시권에서 새로운 행정구역 계층이 탄생한 것으로 1970년대의 행정구역 체계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CA별로 기능과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상이하다.
도시권 중심의 최근 영국의 광역화는 저성장과 재정 긴축의 맥락에서 지역 간 균형 정책이 후퇴하고 성장 위주의 대도시 및 분권 정책의 강화를 시사한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자원들을 동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영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몸부림의 일환이다. 이는 ‘도시 예외주의’로 농촌지역과 낙후지역을 배려하지 않는, 즉 ‘지역정책의 쇠퇴와 도시정책 르네상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농촌지역이 분권 협상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분권 협상의 주요 대상은 기능지역에 기반한 대도시이다.
영국의 광역화 시도가
던져주는 함의
최근 영국에서 나타난 도시권 기반의 분권화는 지역 간 균형에 커다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며 재정규율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시권 협상이 도입되고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 영향 등으로 정치적으로 분권화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성장이 둔화하고 재정 여력이 힘들어지면 이와 같은 유형의 분권화가 단행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분권은 시기와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고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균형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정치·경제적 맥락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수위도시의 과도한 집중과 영향력, 저성장과 그로 인한 재정 여력의 불충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의 최근 광역화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도시의 집적경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보수당 정부의 전략을 반영한다. 이는 대도시의 경제적 발전의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흘러내리는 낙수효과를 가정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효과로 인해 심지어 중심지의 주변 배후지도 그러한 효과를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광역화가 역내에서 하위 지역거점 간에 기능적 보완성에 입각한 네트워크형으로 구성되어야 이러한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향유할 수가 있다.
경제적 가치 일변도의 지역 성장정책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 포용,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 등 삼자가 상호 결합해야 하고 도농 간의 연계와 협력이 일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영국처럼 저성장과 그에 따른 재정 긴축 국면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의해 질식당하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