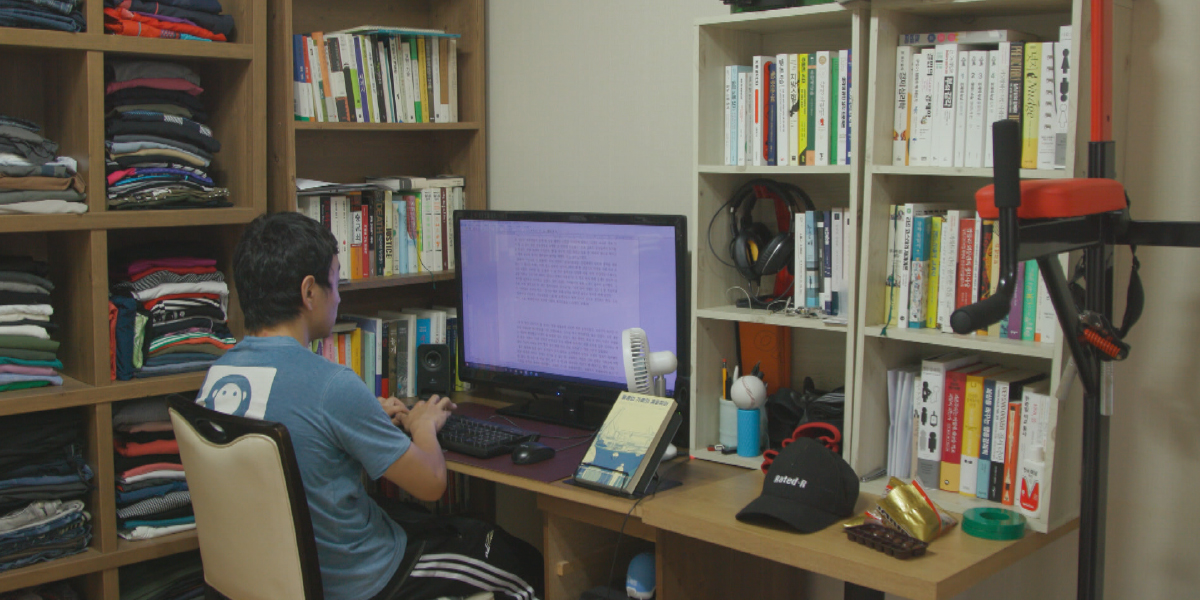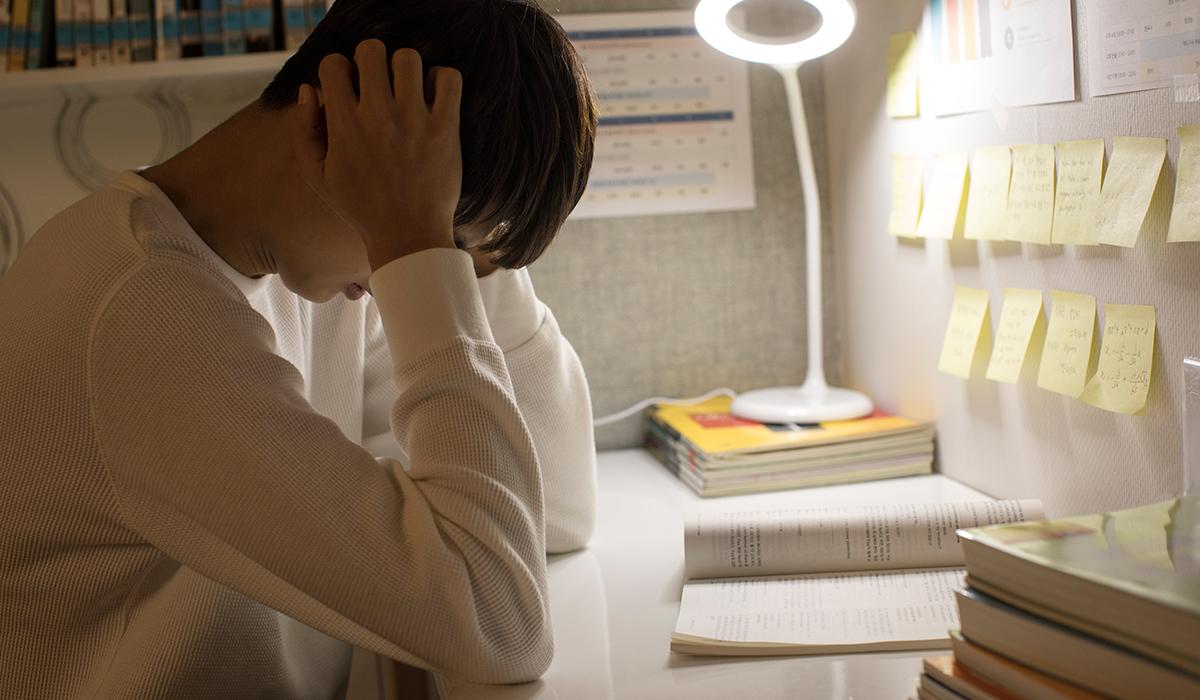‘기회빈곤’에 주목하다
2021년 5월 13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의 연구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신진욱 교수와 미디어 플랫폼 기업 Alookso 천관율 수석 에디터, 신수현 데이터 총괄 책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휴식도 없이 3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는 이후 두 달여 동안 몇 차례 계속됐다. 목표는 단 하나, 진짜 청년문제를 드러내 보자는 것이었다. ‘이대남 현상’, ‘젠더갈등’ 같은 현상이 아니라 뿌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세대인 18~34세 남녀 1,000명, 기성세대인 3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각각 조사했다. 전체 샘플이 2,000명에 이르는 초대형 조사였다. 설계 과정에서 인천대학교 박선경 교수가 합류했다.
주목한 건 ‘기회빈곤’ 문제였다. 지난 세기, 청년은 자산이나 지위가 없어도 기회만큼은 많았다. 청년에게 오늘의 고단함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였다. 청년은 취약계층이 아니었기에 별다른 청년정책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간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어떤’ 청년들은 ‘기회빈곤’을 해결해야 할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남은 건 기회빈곤에 빠진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같은 성취 변수를 배제하고 환경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수백 개의 질문을 두고 난상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신진욱 교수는 한 문항을 지목했다. ‘나는 청소년기에 부모님에게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았다’라는 문항이었다. 하나의 문항이 청소년기 공부환경을 묻는 6개의 세트 문항으로 확대됐다. 부모 소득이나 주관적 계층의식 같은 질문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청소년기의 환경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 부모의 소득을 정확히 알거나 기억해 내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공부하는 방이 따로 있었는지는 잊어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사 결과, 공부방 6문항은 오늘날 청년들의 계층 분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잣대로 확인됐다. 18~34세 청년세대 남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생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그렇다 66% vs 아니다 33%).>, <집에는 내 공부방이 따로 있었다(그렇다 65% vs 아니다 34%).>,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다(그렇다 65% vs 아니다 34%).>, <독서실이나 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그렇다 75% vs 아니다 25%).>, <부모님은 나의 학업을 지원해주셨다(그렇다 83% vs 아니다 15%).>, <부모님은 나의 대학 진학을 원하셨다(그렇다 84% vs 아니다 13%).>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를 세 그룹, 즉 상층 33%, 중층 43%, 하층 19%(모르겠다 응답 5%)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공부방 3그룹’으로 명명했다. 공부방 그룹별로 대학 입시 결과가 갈라졌고, 이후 일자리의 질까지 영향을 미쳤다. 공부방 하층 청년이 취약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확률은 상층 청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삶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공부방 그룹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1> 청년 ‘기회빈곤’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무엇보다 기회빈곤은 청년세대 내 문제인 동시에 계층 대물림 문제였다.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공부방 그룹은 강력한 연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비율은 공부방 상층에서 60%, 하층에서 26%로 상층이 하층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비율은 상층 2%, 하층 21%로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졌다. 청년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공부방 계급론’이 청소년기 이후의 삶, 그 자체를 가르는 상황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단일 청년 남성집단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대남’에 대한 통념 가운데 다수가 허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은 ‘이대남 현상’이 왜 나왔으며, 어떤 계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됐고, 어떻게 확대되어 재생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대남 현상’은 일관되게 ‘공부방 상층 남자’에서 두드러졌다. ‘이대남 현상’을 얘기할 때 나오는 기계적 공정과 능력주의 신봉, 시장주의 등에 대해 하층 남성은 상층 남성과 달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